오피니언
묵현상 단장이 말하는 "3가지 반성, 4가지 전략은"
바이오스펙테이터 김성민 기자
묵현상 단장이 소개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 비전과 목표, 전략은?...“새로운 모달리티(modality) 적극 지원...반환된 임상 과제도 검토”...“병목구간 넘어, 우수한 초기물질 확보” 4가지 전략

▲지난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신약개발사업 RFP 발표 및 세부원영계획설명회’발표 현장에서 묵현상 단장 발표모습, 바이오스펙테이터 촬영
새로운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이 지난 3월 4일 공식출범한지 한달만에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전략이 모습을 내보였다. 10년동안 2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앞선 범부처신약개발사업과 비교해보면 매년 신규과제수는 18개→129개, 예산은 330억원→1500억원, 사업단 인력도 20명→5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사업단의 목표도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그러나 이전 범부처신약개발사업과 비교해 중요하게 바뀐 것은 전체 규모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다.
묵현상 신약개발사업단장은 “신약개발사업단의 새로운 출발을 반성문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범부처신약개발사업 단장을 맡았고, 좋은 성과를 얻었다”며 “27개 과제의 글로벌 라이선스아웃 실적 규모가 총 15조원을 넘었고 여기서 계약금(upfront)과 마일스톤으로 받아들인 현금만 약 7500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 되돌아보면 반성해야할 3가지 부분이 있다”고 지난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신약개발사업 RFP 발표 및 세부운영계획 설명회’ 발표 현장에서 말했다.
묵 단장은 그 3가지로 “첫째, 얼리스테이지(초기) 과제에 많은 지원을 하지 못했다. 둘째, 사업단의 목표가 라이선스아웃이다보니 글로벌 임상까지 직접 끌고가지 않고 먼저 팔 생각을 했다.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 등 몇가지 과제가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라이선스아웃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크게 반성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그는 “셋째, 공동연구(collaboration)를 부추기고 등을 떠밀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잘 하지 못했고, 단독 과제에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을 보면 제노스코에서 만든 물질을 오스코텍이 초기 투자를 하고, 비임상부터 유한양행이 참여하고, 임상1상부터 KDDF가 지원했다. 이후 임상1b상부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조병철 연구팀까지 5군데 기관이 힘을 합쳤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 다른 과제들도 연합군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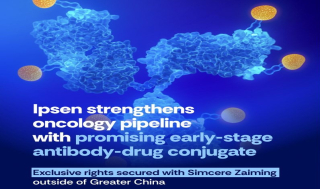



![[인사]한미그룹 2026년 정기 임원인사](https://img.etoday.co.kr/crop/77/77/2071974.jpg)

![[인사]한미그룹 2026년 정기 임원인사](https://img.etoday.co.kr/crop/74/74/207197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