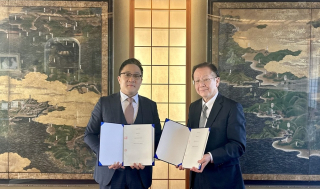오피니언
‘리제네론’으로 본 진정한 "플랫폼", 그 실체를 찾다
바이오스펙테이터 김성민 기자
[빅바이오텍 케이스 스터디<2> & 창간8주년 기획-'과학(Science)' 그 길을 묻다] 1989년, 녹아웃(KO) 기술을 첫 도입한 바이오텍 리제네론, 1000억弗 성장까지 결정적 사건과 변곡점, 제품은?..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한 "5가지 비밀은?"

대표적인 플랫폼 바이오텍으로 알려져 있는 리제네론 파마슈티컬(Regeneron Pharmaceuticals)은 정말 플랫폼 회사일까? 어쩌면 리제네론을 플랫폼 회사라고 말하는 것이, 제2의 리제네론을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리제네론을 단순히 항체 플랫폼 바이오텍이라는 시각으로만 이해한다면, 항체 기술의 접근성을 고려해봤을 때 아직 또다른 리제네론이 나오지 않는 것이 상당히 의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리제네론은 지난 1988년 설립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전학(genetics)에 뿌리를 둔 회사였으며, 리제네론이 시판한 말그대로 ’모든 신약‘은 유전학에서 시작해 검증해 개발한 것이다. 오히려 리제네론을 유전학 회사라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 온 길과 현재 가고있는 길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리제네론을 굳이 플랫폼 회사라 규정한다면, 그 플랫품이란 초기 아이디어에서 실제 약물시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500분의1 또는 1000분의1 확률인 신약개발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신약개발의 맨 앞단에서부터 끊임없이 검증해 시판에 이르기까지의 성공 재현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다.
리제네론의 신약 포트폴리오를 보면, 바이오텍 심지어 빅파마와도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 바로 치료영역(therapeutic area, TA)에 구분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리제네론이 시판허가를 받은 신약 제품은 총 9개(코로나 긴급사용승인건 제외)로 안과질환, 염증질환, 항암제, 심혈관질환, 희귀질환 등으로 사실상 타깃질환에 경계가 없다. 치열한 신약개발 경쟁 속에서 타깃질환 영역을 넓히는 것은, 빅파마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런면에서 리제네론이 넓은 질환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리제네론은 흔히 안약 블록버스터 ‘아일리아(Eylea, aflibercept)’의 매출이 나오면서 급격히 성장한 회사라는 것에 많이 포커스돼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신약을 출시하기까지 20년, 그리고 흑자를 내기까지 2012년으로 설립부터 꼬박 24여년이 걸렸다. 구체적인 시점으로는 2012년 1분기 아일리아가 출시된지 1년만에 올린 매출액 1억2400만달러를 포함해 총 3개 제품 매출이 2억3200만달러가 나오면서 첫 흑자를 기록했다. 아일리아 출시 바로 직전까지 리제네론의 누적손실은 12억달러에 달했으며, 당시 업계에서는 버텍스 파마슈티컬(Vertex Pharmaceuticals)과 함께 수억달러가 쏟아부어진 '돈 먹는 바이오텍'으로 여겨졌다. 리제네론이 그동안 쓴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까지는 26년이 걸렸다. 리제네론은 20년이 넘는 시간을 ‘비즈니스를 모르는 과학자 회사‘라는 시장의 조롱을 견뎌야 했다.
그러나 주목해볼 또다른 수치가 있는데, 2013년 기준으로 글로벌에서 10년간 3개 이상의 신약을 시판한 회사가 각 신약마다 쓴 비용을 계산해봤을 때 (거의 빅파마 위주의) 평균 R&D 비용은 43억달러인 반면 리제네론은 7억3600만달러에 그쳤다. 화이자가 쓴 약물당 78억달러에 비교하면 10분의1 비용 차이다. 그런면에서도 리제네론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전혀 다른 회사였다. 그러면 리제네론은 20년이 넘는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고, 무엇이 다른 것일까? 답은 명확하다. 리제네론은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2명의 공동창업자(co-founder)가 그 무엇보다 '사이언스(Science)'를 우선순위로 지켜왔으며, 이러한 철학을 추구해 35년이 된 지금 시가총액 1000억달러가 넘는 바이오텍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부터 리제네론이 걸어온 그 무거운 사이언스의 세계로 들어가보려 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