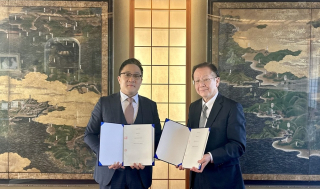오피니언
뇌질환 조기진단에 무게..'gold standard' 발굴 나선다
바이오스펙테이터 김성민 기자
[실패 거듭하는 CNS 신약개발②]FDA 알츠하이머병 개혁안의 시사점? 증상없는 잠재적 알츠하이머병 환자 예측하고 임상서 약물투여에 따른 환자병기상태 평가하는 아밀로이드, 타우 등 단백질 표지 PET 개발 가속화 外 약물타깃에 따라 혈액, CSF에서 바이오마커 함께 평가
알츠하이머병 등 뇌질환 치료제 개발이 조기진단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15일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하면서다. 현재 알츠하이머병 분야에서 조기진단과 치료는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다. 그중 조기진단은 알츠하이머병이 악화되기 전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차적인 스크리닝하는 목적이다. 조기진단을 통해 더 빨리 환자를 찾아낼수록 좋다. 그러나 치료제가 없는 실정에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5~10년후 인지저하증상을 보일 환자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항상 뒤따랐다. 다만 최근 빅파마의 알츠하이머병 임상대상이 앞단의 초기 환자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베타 아밀로이드(Aβ, 이후 아밀로이드로 표기) PET 이미징 촬영이나 유전자검사의 지표를 통해 환자를 스크리닝을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임상승인여부는 인지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FDA가 임상적 증상이 전혀 없는 초기환자에서 기존의 인지기능 평가가 아닌 바이오마커를 인정한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0% 성공률’의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생긴 것이다. 여러 진단기법을 통해 잠정적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판별되는 환자에서 ‘병기진행을 늦추거나 혹은 막을 수 있는 약은 무엇인가’라는 새로운 미션이 생긴 것이다. 신약승인을 받기위해 아주 적절한 초기환자를 선별하고 약물효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gold standard’ 바이오마커를 찾기위한 고민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안으로 조기진단과 치료제 개발 사이의 더욱더 긴밀한 연결고리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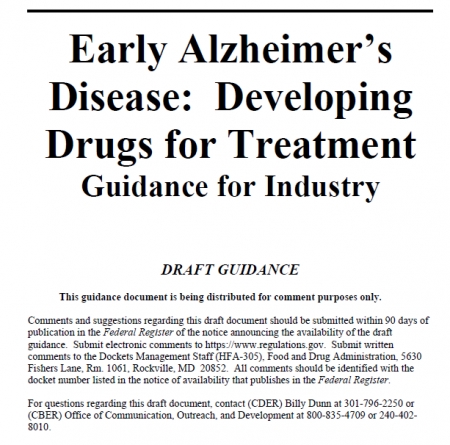
▲2월 15일자로 발표된 FDA 알츠하이머병 개혁안 초안
FDA가 알츠하이머병 임상개혁 나선 배경은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조기진단을 통한 초기환자 발굴이다. 그러나 다른 질환에서의 신약개발과는 그 개념이 다르다. 물론 암질환도 초기에 발견하면 좋다. 치료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제약사 입장에서 계속 약을 만들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다. 암진화(cancer evolution)에 따른 약물내성 현상 때문이다. 암이 어떤 트릭으로 약을 피해간다면 그 트릭을 겨냥한 약을 개발하면 된다. 시판된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 3차 치료제 개발이 가능한 이유다. 비소세포암에서 3세대 약물이라 불리는 EGFR T790M 타깃, 흑색종에서 차세대 BRAF V600E 타깃을 겨냥한 약 등 그 예는 많다. 그렇지만 알츠하이머병은 경우가 달라 보인다.... <계속>